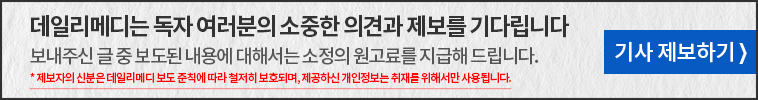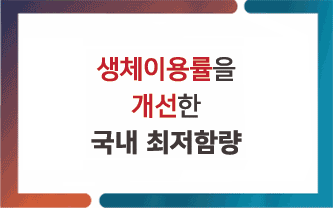소아청소년과는 분명 고단한 진료과이지만 그럼에도 그가 현장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람' 때문이다.
유영명 교수는 "고위험 신생아였던 아이가 세월이 흘러 유치원에 입학한 후 부모님과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모습을 보면 몸에 전율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없으면 아이들은 평생 장애를 갖고 살거나 생존이 힘들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살리고, 장애를 갖지 않도록 하는게 숙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신 22주에 390g으로 태어난 아이가 건강하게 퇴원한 기억도, 반대로 24주에 700g으로 태어나 한 달 만에 사망한 아이도 그가 품고 사는 사명감을 더욱 탄탄하게 만든다.
그는 "사망한 아이의 보호자가 둘째 출산 후 우연히 마주쳤는데 '첫째 잘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건네셨다. 너무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술회했다.
"돈보다 보람 있는 인생 살고 싶다"
유 교수가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한지 어느새 7년, 신생아집중치료센터 센터장이 된지는 4년가량이 흘렀다.
그동안 중증도가 높아지고 주변 병원에도 소문이 나면서 강원권뿐만 아니라 경기도, 충정도, 경상도에서까지 고위험 산모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보내는 사례가 늘어났다.
다만 소청과 기피 현상과 지역병원에 대한 낮은 선호도로 전문인력은 늘 부족하다. 병원에서는 "얼마든지 지원할테니 충원하라"고 하지만 접수되는 지원서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터뷰도 하고 방송 제안도 응했다. 저로 인해 신생아중환자실에 관심을 갖게 되면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본다"고 털어놨다.
이처럼 고단한 상황이지만 결코 지역의료를 떠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여기는 한 명 없어지면 다 무너진다. 중부권에서 담당하는 영역이 크기 때문에 무너지면 산모와 아기들이 갈 곳이 없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개원가로 나가면 많이 벌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한 번 사는 인생 남들에게 도움을 주며 살고 싶다. 죽기 전에 '참 보람 있는 인생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필수의료 수가 개선 절실…의사만 아닌 간호사 보상도 함께 이뤄져야"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개선책이 무엇이라 생각하는 지 묻자 수가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그는 "3~4년 전 아이가 감기에 걸려 동네 소아과에 갔다. 진료비로 800원을 냈다. 나오면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았다. 남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800원짜리 의사'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마냥 돈을 많이 달라는 게 아니다. 수가를 제대로 매기면 의사가 다 갖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환경 개선에도 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가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큰 개선이 없는 상황이지만 의료진에 대한 국가 보상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 교수는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정부에서 보상을 늘리려고 한다. 다만, 의사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다. 같은 의료진인 간호사에게도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계 내에서도 소청과의 전문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심어져야 한다. 그러다 보면 의대생들 인식도 바뀌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실 돈 때문에 의대에 진학한 사람은 많지 않다. 성적 때문에 온 경우도 있겠지만 소명 때문에 진학한 사람이 대부분이다. 필수과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 지원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신생아집중치료센터 운영에 대한 목표와 바람을 전했다.
그는 "지금도 이름은 센터지만 병원 한쪽 귀퉁이에 있는 '이름만 센터'다. 향후에는 소청과,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가 함께하는 제대로 된 클리닉으로 키우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공간적으로 수술방, 신생아중환자실 등이 떨어져 있는데 클리닉 안에서 모든 게 이뤄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개인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어떤 의사가 되고 싶다' 이런 건 없다. 그저 오랫동안 건강하게 일하고 싶다. 갑자기 쓰러져 진료를 못하게 될까 봐 제일 걱정"이라고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인터뷰를 마쳤다.